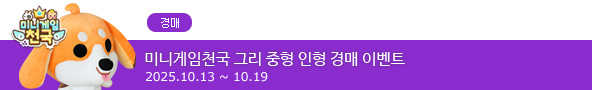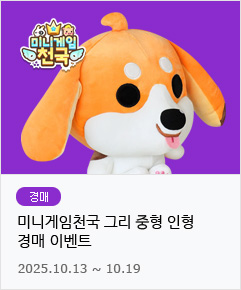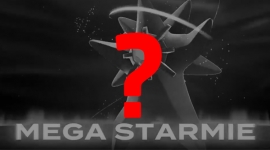▲
게임의 본질은 재미다! 게임문화 심포지엄 `나는 게임이다` 현장
아름다운 오페라를 감상하거나 기분 전환용으로 신나는 대중가요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음악이 사회적 혹은 교육적으로 무언가 좋은 영향을 끼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 음악이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준다면 그 자체만으로 존재가치가 충분한 ‘문화 예술’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정서 함양, 집중력 향상, 심리적 안정감 제공 등 부수적인 순기능은 말 그대로 ‘부차적’인 영역으로 언급될 뿐이다.
2월 21일, 게임문화재단의 주최 하에 열린 게임문화 심포지엄 ‘나는 게임이다’ 현장에서 게임을 사회적, 교육적 효과를 검토하기 이전 ‘놀이문화’로서의 가치를 조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탄생한 게임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서 온전히 기능하도록 정부와 학계 그리고 관련 업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림대 언론정부학부 박태순 교수는 “게임의 본질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본성이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게임을 통해 얼마나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하는가, 혹은 게임에 아이들이 얼마나 돈을 쏟아 붓는가가 아니라 게임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얼마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가가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
박태순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최근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게임이 지목되는 등 사회 전반의 여론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교육과 게임을 접목한 ‘기능성 게임’을 긍정적인 예로 지목하고, 이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 역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심포지엄에서는 ‘기능성 게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능이 없는 게임은 무가치하다’라는 사회적인 통념을 굳히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위원을 역임한 김상우 기술미학연구회 연구원은 “게임의 사회적인 가치를 기능성과 연동하면 비기능성 게임의 존재가 역으로 압박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며 “지금까지 한국에서 개발된 게임이 사회적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밝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김상우 기술미학연구회 연구원
열심히 사회에서 자기 역할에 임하고 있는 구성원에게 쉴 곳을 열어주는 것 자체로 게임의 존재가치는 충분하며,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 ‘자기계발’과 같은 순기능이 발현된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의견이다.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외화 영화 혹은 드라마를 감상하며 영어공부를 하는 학생처럼 말이다.
정부의 게임산업 진흥 역시 교육적 효과나 수출성과를 강조하는 것보다 게임 자체를 문화화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연구 역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게임을 부작용이 최소화된 문화로 수용할 방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에서 거론된 주요 의견이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산업진흥이나, 청소년 보호냐라는 이분법의 감옥에 갇히지 말고 문화적 가치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지고 놀만한’ 게임을 만들자!
심포지엄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는 국내 게임업계 역시 주류 놀이문화로 자리잡은 게임을 만드는 창작자로서 무거운 사회적 책임감 하에 대중이 즐겁게 ‘가지고 놀만한’ 작품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지원하는 문화연대 정소연 팀장은 “규제 일변도로 나선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있으나,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넋 놓고 앉아만 있던 각 게임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박근서 교수는 “홈월드2를 즐긴 아들이 ‘정말 아름다운 게임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게임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라며 “게임의 문화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제작 방향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전했다. 즉, 기능성 게임 제작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진정한 재미와 감동을 주는 완성도 높은 게임 창작에 각 개발사가 좀 더 진중한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
RTS 명가 렐릭이 개발한 `홈월드2`
게임평론가로 활동 중인 박상우 연세대 겸임교수는 "게임에 관한 산업적, 혹은 경제적 담론은 ‘돈 벌이에 아이들을 이용한다’는 반론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 라며 "업계가 게임은 산업이기 이전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문화라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다"라고 전했다.
게임업계가 정부의 규제에 힘없이 끌려가는 현상을 꼬집는 의견 역시 현장에서 큰 공감을 샀다. 문화연대 정소연 팀장은 “게임을 비롯한 정보가 공평하고 자유롭게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에 각 기업이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게임 자체가 음악과 미술, 시나리오와 기술력 등 다양한 분야가 얽힌 문화 산업의 총체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미 많은 사람의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잡았음을 호소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게임이 전방위로 두드려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김상우 연구원은 “스크린쿼터제를 실현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영화업계와 비교하면 게임업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만화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힌 심포지엄 청중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미적지근하게 행동하면 게임산업 역시 만화산업과 같은 길을 걸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심포지엄을 취재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한 할머니가 피쳐폰 게임을 즐기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연세가 지긋한 분이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 자체가 매우 생소하다는 것이다. 곧이어 게임 전문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게임’을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무의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언젠가 게임은 청소년을 넘어 전 세대의 놀이문화로 자리할 것이다. 지금은 그 과정을 좀 더 순탄하게 다지기 위해 업계와 정부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 대중을 모두 고려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

- 14년 6개월간 이동해서 마인크래프트 끝에 도달한 남자
- 대놓고 베낀 수준, PS 스토어에 '가짜 동숲' 게임 등장
- 디아블로 4 포함, 블리자드 게임 최대 67% 할인
- 한국어 지원, HOMM: 올든 에라 스팀 체험판 배포
- 대파를 끼울 수 있다, 포켓몬스터 '파오리' 재킷 등장
- 챗GPT를 TRPG ‘게임 마스터’로 만들어보자
- [순정남] 연휴 마지막 날, 슬프지만 이들보단 낫다 TOP 5
- 국내 게임패스 자동결제 유저, 당분간 기존 가격 적용된다
- [롤짤] 4시드 T1보다 낮은 LPL, 롤드컵 LCK 독주?
- 후부키·가로우 온다, 오버워치X원펀맨 2차 컬래버 예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